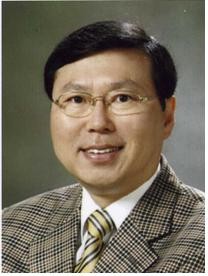 |  | | | ⓒ 황성신문 |
폭염이 지나자마자 걱정거리가 집안의 윗대 산소의 벌초였다.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었고 새벽에 비가 내려서 일가친척의 집집마다 전화를 해서 연기하느냐 그대로 강행하느냐 의논 끝에 우천에 관계없이 정해놓은 날짜에 하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각자 맡은 여러 가지 벌초장비와 묘제를 지낼 준비를 해서 집합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다.
시작할 때 빗방울이 떠서 걱정했지만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부조를 해줘서 다행이었다. 해마다 찾는 산소의 무성한 풀은 여느해와 다를 바 없었지만 올해 여름의 그 뜨거운더위 속에서도 더 억세게 잘 자란 것이 원망스러웠다. 한군데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곳저곳 몇 군데 산등성이에 흩어진 스물 몇 기의 산소를 찾아다니며 벌초를 하는 건 만만찮은 일이었다.
요즘은 거의 예초기라는 자동 벌초장비를 이용하고 자가용을 타고 산소 가까운 곳까지 갈 수있지만 예전에는 지게를 지고 먼 길을 걸어가서 낫으로 벌초를 하고 그 풀을 거둬서 소먹이로 하기 위해 집으로 가져왔다.
그 시절에는 벌초를 할 때면 숫돌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무디어진 낫을 갈아 사용하였다. 벌초를 하다가 힘이 들면 숫돌에 낫을 간다는 핑계로 오랫동안 쉬고 있다가 어르신께 야단을 맡기도 한 추억도 있다.벌초는 음력 팔월 추석 이전에 조상의 묘에 자란 잡초를 베고 묘 주위를 정리하는 풍속으로 주로 백중 이후인 7월 말부터 추석 이전에 이루어진다. 백중이 지나 처서가 되면 풀의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이때 벌초를 하면 비교적 오랫동안산소가 깨끗이 보전되며 추석에 성묘를 하기 위해선 추석 전에 반드시 벌초를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기도 흉하며, 자손이 없는 묘로여기기도 하였다. 또한 자손이 있음에도 벌초를 하지 않는 행위는 불효로 간주되었다.
우리 민족은 조상의 묘를 살피고 돌보는 일은 효행이자 후손들의 책무라고 여겨왔다. 예전에 비하면 이러한 사상이 많이 퇴색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추석 성묘 전 벌초를 중요하게 여겨, 추석이 가까운 몇 주의 주말은 성묘하는 차들로 인하여 도로가 붐비는 정체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조용하던 산과 들에 예초기 기계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혹시 벌초할 시간과 사정이 여의치 않는 사람은 벌초 대행업체에 맡겨서 벌초하기도 한다. 갈수록 벌초대행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물질의 만능으로 조상을 생각하는 중요한 덕목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벌초는 장묘문화와 관계가 있다. 유교적 전통에 기초한 매장문화를 오랜 관행으로 지켜왔던 우리나라는 매년 여의도 면적의 1.5배 이상을 묘지로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일 이러한 매장문화가 계속 지속된다면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흉물스럽게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됨은 물론이거니와 심각한 묘지공급 난으로 인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우려해 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묘지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그동안 전통을 고수해 온 매장제도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화장률이 약 80%정도로 화장 문화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벌초는 우리 대가 마지막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벌초 자체는 오랜세월을 두고 계승되어 온 효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고유문화의 하나로 인식함이 옳을 것같다.
벌초하러 가보면 윗대 조상의 산소 경역의 빈공간이 너무 넓어 활용 방도를 생각해 보았다. 어느 집안을 막론하고 이런 산소가 많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앞으로 집안에 누구라도 상을 당하면 화장을 하여 종이나 나무로 된 유골함에 넣어조상의 산소 주변 빈 공간에 땅을 파고 묻고 잔디를 덮어 봉분 없는 자연장의 묘를 차례대로 조성하여 집안친척 묘원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한 곳에 수많은 산소를 조성할 수있으며, 후손들은 여기저기 흩어진 산소를 찾아 벌초해야 하는 부담도 덜고 집안친척들이 한 곳에 모여 조상을 기리며 우리의 전통도 지켜갈 수있다고 생각한다. 장묘문화 개선과 아울러 벌초문화도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경주대학교 조경도시개발학과 최재영 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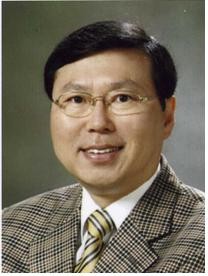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