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황성신문 |
▲ 도깨비불 유영
|  | | | ⓒ 황성신문 | |
|  | | | ⓒ 황성신문 | |
|  | | | ⓒ 황성신문 | |
우물파고 살았던 집에 살 때이었다. 집 앞에는 작은 도랑물을 건너고 논 하나 지나면 종백씨 집이다. 집에서 서편으로 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이 여덟 동이나 있다. 모두 세를 내주다. 집 뒤 곁으로 해서 언덕과 논밭을 지나면 언덕 밑에 기장(機張)댁 할머니께서 아들과 손녀가 살고 있다. 이런 숫자로 우리 마을이 전부다. 아니 소한들 들판 가장자리 외딴마을이다. 이름 하여 ‘새보’ 동네다. 현재는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곁에 푸른색 농장하는 곳이다.
집은 들판 속에 살지만 토함산 쪽을 보면 동해남부선 불국사기차역이 지척으로 있다. 그곳에는 전기가 들어와서 휘황찬란했다. 그 기찻길 하나 사이로 이렇게 극과 극으로 살아갔다. 그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못했다. 우리는 농촌, 기찻길 위는 사하촌 소도시로 시내버스도 다니고 장거리 직행버스도 운행했다. 서울로 통하는 기찻길은 연이어 부산으로 내려가고 했다. 이곳은 길도 논둑 아니면 밭둑이었다. 녹색 들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보면 저 멀리 아래시래 당산나무가 있고, 그 옆에 상여 집과 삼굿도 있다.
이슬비가 오면서 습도 높고 저녁부터 찌푸린 날씨였다. 밖에 나갔던 넷째 형이 나를 불렀다. 덩달아 어머니도 나왔다. 당산나무가 있고 상여집이 빤히 보이는 방죽 밑 1km도 채 안되었다. 한 곳에서 도깨비불이 보였다. 연이어 유영(遊泳)하고 있다. 오늘날로 치면 레이저 쇼 같다. 집에서 돈 안내고 도깨비불 쇼를 구경한다. 한편으로는 겁내 하면서 윗마을 다니기가 무서워 걱정이다.
하나의 도깨비불이 확 나타났다. 일직선을 향해 도깨비불을 흘리기 시작했다. 한 개의 도깨비불이 여러 개의 도깨비불을 만들었다. 아주 잽싸게 지나갔다. 한 곳에 모두 멈춰 서 버렸다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또, 반대편에서 도깨비불을 만들어 춤추는 것이다.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눅눅한 밤에 반복하는 것이다.
“도깨비불! 이제 봤제. 쓸데없이 일 안하고 윗마을에 놀러가지 마라. 밤에 새끼도 꼬아야 하고, 가마니도 쳐야지. 아직 짚을 간추리지도 않았네. 뭐 하노? 빨리 안하고!”
아버지는 유영하는 도깨비불을 이용해 우리가 윗마을에 놀러가지 못하도록 타이르는 듯 으름장을 놓았다.
도깨비불은 무엇인가? 왜 우리 눈에 보이는가? 어릴 때는 크게 부라린 눈을 가진 도깨비 말만 들어도 무서워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불을 보고나니 나이어린 우리들로서는 정말 무서워서 꼼짝 못했다.
그날도 꼼짝없이 사랑채에 차려 둔 가마니틀에 가마니치기로 짚을 먹이었다. 사르르 짚이 들어가서 씨줄이 날줄 사이로 통과하면 이내 아버지의 그 육중한 바디 내리치는 소리는 ‘쾅! 쾅!’ 두세 번으로 가마니의 면적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다. 가마니치기는 바디에 걸가는 새끼도 꼬아야 한다. 가마니 짜기에서 날줄이 될 낱개의 짚을 물에 담가서 물 먹여두었다. 짚의 밑동을 똑같이 작두에 썰었다. 꼭 묶어서 나무망치로 볏짚을 두르려 부드럽게 해 놓아야한다. 이런 일을 밤새껏 하니 가마니 치는 공장이 됐다. 한쪽에서는 멍석도 만들고, 밧줄도 엮었다. 또 밀 방석이나 삼태기도 만들었다. 딱딱한 나무지게를 등을 받쳐 주는 것으로 고향에서는 ‘떵띠’라고 하는 지게 ‘등태’도 만들어 농사준비를 단단히 했다.
하루는 혼자 놀기 너무 심심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윗마을로 그만 놀러 가버렸다. 쇠죽 끓이는 것, 여물 썰어두는 등 모두 던져두고 윗마을로 놀러 갔다. 엊그제 아버지가 도깨비불을 설명하면서 놀러 못가도록 그만큼 얘기를 해 두었는데도 친구 찾아 놀러 가고 말았다.
오랜만에 동사마을 친구들과 만나 노느라 정신이 없었다. 모두 집집마다 저녁 먹으라는 소리가 들려도 아무도 집에 가려고 하지 아니했다. 나도 오랜만에 놀러 간 것이라 노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다. 어둠살이 치는 것도, 이슬비가 오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선 긋고 넘어가고 밀치는 게임인 ‘카이루’를 하면서 끝까지 밤에도 놀았다. 어둠이 너무 짙어왔고, 비가 내려서 친구들이 모두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때서야 정신을 차려 보니 어느 듯 시간은 흐를 대로 흘렀다.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아랫동네 인 새보를 내려다보니 기가 막히고 말았다. 우리 집 뒤 곁에 도깨비불이 쇼를 하고 있었다.
집으로 내려가려면 동사마을 끝집을 지나고, 세 번째 살던 작은 동네를 지나야 했다. 논둑길이고 역에서 내려오는 도랑물을 건너뛰면 또 논이고, 겨우 우리 다섯 마지기 묘답 논을 지날 때가 문제였다. 푹 꺼진 곳이었다. 간혹 밀개산 빈수골에서 삵이 나타나서 모래를 덮어씌우는 곳이었다.
작은 묵지 둑을 오르면 이제는 작은아버지 밭이다. 그곳에는 뽕나무가 듬성듬성 서 있고, 간혹 뽕나무가지에 비닐봉지가 걸려서 바람에 펄럭인다. 마치 처녀귀신이 빨리 오라고 손짓하듯 하다. 밭가 언저리에 묘지 하나 있었다. 이를 지나려면 우리 집 뒤에서 유영하는 도깨비불을 보아야만 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도깨비불에 정신이 팔려 혼비백산하는 곳이다.
사실 도깨비불은 자연으로 화학반응이 일어난 결과에 불과하다. 인(P)화합물이 물과 작용해 분해될 때 생기는 인화수소가 상온에서도 불이 붙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현실은 무서움뿐이다. 집 뒤 언덕에는 예전 무덤을 쓰기 전에 2~3년 채봉(시구를 나무위에 얹어 두었다가 육탈 후 뼈만 묻었다는 것)을 했던 곳이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노래아닌 고함으로 내가 간다고 소리소리 질러댔다. 탱자나무 울타리 곁으로 간혹 찔리기도 하면서 죽어라 뛰어야만 하는 코스이었다. 겨우겨우 내가 판 우물까지 오면 이제 살았다. 해당화 꽃들이 반겨 주는 우리 집 앞이었다.
이제 다시는 아버지 말씀을 어기지 말아야지 생각했다. 집에서 쇠죽이나 쑤고, 거름이나 거둬들이고, 닭이 올라 갈 수 있도록 홰를 놓아 주는 일도 해 아버지의 칭찬을 듣고 살아야지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립문을 열고 들어서는 데 앞쪽 남자 화장실에서 아버지가 나왔다. 들킬까 봐 간이 콩알만 해지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마침 어둠이 가려서 발견하지 못했다. 토방뒷문으로 들어갔다. 이내 내방 문을 열고 나오면서 잠이 들었다가 소변보러 나오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겨우 꾸중을 모면했다.
다시는 윗동네에 혼자 놀러가지 않았다. 도깨비불이 아버지 꾸중보다 더 무서웠다. 나는 그렇게 도깨비불이 유영하는 곳, 외딴곳인 벌판 속에서 살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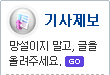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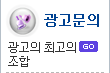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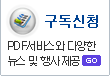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