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황성신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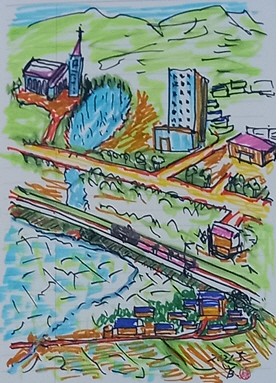 | | | ⓒ 황성신문 | |
아니 이럴 수가 초겨울에 빨래를 하다 빨래터에서 출산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산모가 갓 낳은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다는 전설 아닌 실화가 우리 동네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시골에서는 겨울이라도 빨래를 집에서 하지 못하였다. 모두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빨래터로 가지고 나와서 빨래하는 것이었다. 이런 것이 일상생활이었다. 흔히 집으로 찾아가면 만날 수 없어도 빨래터로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적확하였다. 빨래터는 자연히 시정(市井)으로 우물과 거의 붙어 있는 것이 상식이었다.
어려서 살던 곳 우리 마을에서는 이상하게도 우물은 마을 쪽에 꼭 붙어 있었다. 빨래터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나도 궁금하던 터에 그 원류(源流)를 찾아 나섰다. 찾아 나선 이유는 왜 우물과 떨어진 곳에 빨래터가 생겼는지 하는 의문이다. 초가을만 되어도 손이 시린데 이상하게도 가을이 깊어 갈수록 물이 따뜻해져 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조사할만한 이유이다. 그러나 과학자가 아닌 어린아이로서 무슨 결과를 밝힐 수 있었겠는가?
세월이 한참 흘러갔다. 보 이름도 궁금하였다. 용마래(龍馬來)? 용마가 온다? 누구에게나 물어 보아도 전해오는 이름이라고만 하고, 그 어원을 잘 모르고 있었다. 용마래보머리 바로 곁에 불국사국민(초등)학교 교장사택이 있었다. 또 맞은편에 나중에 구정교회가 들어섰다. 초등학교시절 겨울철에도 보 곁에 가면 김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교육대학 졸업하고 교사발령이 나지 않아 집에서 쉴 때 예비군훈련이 나왔다. 그날이 1973년 4월 1일 “예비군창설기념일”이었다. 황성공원 근처 공설운동장에서 기념식이 있었는데 참가할 사람은 하라고 하였다. 가지 않을 사람은 용마래보에 청소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기념식 가면 일장연설을 들어야하고, 또 자비로 차타고 황성공원(약1.5km)까지 걸어가야 했다. 용마래보에 청소하고 집으로 일찍 돌아 가 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그날 열심히 용마래보를 청소하였다. 오늘날 자연보호운동 차원이었다.
1981년 초교 교사를 사표내고, 대학으로 전직하여 대구로 가게 되었다. 발령 그날 “대구 모 신문”일간지에 공고가 하나 나와 있었다. 불국사온천개발(주) 상임이사로 대학서무주임 이름이 나와 있었다. 확인한 결과 바로 고향 용마래보에 온천이 개발된 것이었다.
나중에 현장으로 가보니 교장사택이 모두 헐리었고, 곁에 용마래보는 그대로 있는데 온천만 개발되었다. 시골에 10층의 거대한 온천호텔이 서게 된 것이다. 듣기로 온천물은 원탕(元湯)이라 정말 좋다고 하여 종반계중에서 단체로 목욕탕에 입장하였다. 말 듣던 대로 물이 좋았다. 물의 질이 미끄럽고 피부에 와 닿는 모양새가 왠지 모르게 좋게 느껴졌다. 단체 목욕탕은 하나의 룸을 주었다. 놀다가 다시 온천탕에 들어가서 시간 나는 대로 목욕을 즐길 수 있었다. 현재도 용마래보는 존재하지만 원수(元水)는 모두 온천 호텔에서 빼내어 사용하였다. 이제 겨울이라도 수증기가 잘 올라오지 못하였다. 그 온천은 오래 지속 발전하지 못하고 현재는 사라졌다. 요즘은 대신에 D온천만이 남아있다.
용마래보는 한겨울에도 철길 밑 굴로 흘러나오던 그 물에 온기가 있었다. 그런 따스함을 느끼던 것을 이제 개발되어서 온수는 간곳이 없었다. 오ㆍ폐수만 흘러 내려왔다. 옛날의 집 앞 빨래터까지 온수가 느껴지던 것은 사라지고 오ㆍ폐수만 내려오니 이런 일을 어찌할 수가 없다. “용마래보야! 미안하다. 인간들이 욕심 많아서 모두 개발하였구나. 언제나 깨끗하게 흘러가던 정안수가 이제 오염수로 변했구나.” 용마래보 깨끗한 물은 간곳이 없다. 사라졌다. 모두가 인간이 저지른 욕심에서 시작되었다. 욕심은 어디까지가 한계더냐? 누가 말릴 수 있단 말인가? 모두가 재화에 눈이 멀어 아직도 개발만 앞세우니 이런 일을 어찌하랴. “용마래보야 미안하구나! 참말로 미안 하데이.”
용마래보는 찾아가 보아도 말이 없다. 인간이 저지른 죄 값을 21세기에는 톡톡히 치르고 말 것이다. 용마래보는 어디의 도롱뇽처럼 재판도 할 수가 없다. 용마래보는 나설 수가 없다. 용마래보는 도롱뇽도 아니다. 용마래보는 할 말이 없다. 인간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데 용마래보는 수면만 고요하다. 수증기도 겨우 조금만 오르고 있다.ⓔ
(20121007)
----------------
*시래동 자연 : 갓안보, 굼보, 상보, 새보, 용마래보, 중보 등의 보(洑), 광산(光山), 물미(-尾), 구매(舊梅), 아랫시래, 새보, 윗시래, 중방(中坊) 시장거리, 소전, 쪼진뱅이 등의 자연마을 이름, 광정미기, 왼고개 등의 고개, 빈수골, 산막골 등의 골짜기, 야산인 밀개산, 개남산, 바위인 쪼진방우 등이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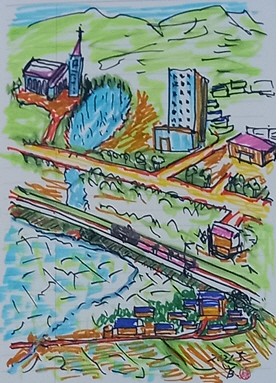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