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황성신문 |
|  | | | ⓒ 황성신문 | |
동네에 갑자기 불도저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옛날 방죽은 모두 사라지고 제방이 쌓아졌다. 새로운 방천이 생겼다. 방죽이 있던 시절에는 수양(垂楊)들이 늘어져서 운치 있는 둑이었다. 그곳에서 연애하는 사람, 수양버들 밑에 낮잠 자는 사람, 꼬맹이들 매미 잡고 숨바꼭질 하던 금모래, 은모래 장소를 제공해 주던 그런 곳이었다.
그러나 홍수가 자꾸 나기 시작하면서 예산이 배정됐다. 1959년 태풍 사라호가 지나가면서 관에서 제방공사를 서두르게 됐다. 그 좋은 수양을 모두 베어서 팔아 마을공동기금으로 넣었다. 이제 그런 수양은 볼 수도 없어졌다. 수양가지 꺾어 호드기 불던 시절도 있었다.
그냥 불도저 소리만 윙윙 날 뿐이었다. 화물차가 바쁘게 운행되면서 제방에 쌓을 견칫돌을 실어 날랐다. 구덩이 파고, 말목 박고 줄치고 가지런히 예쁘게도 제방을 쌓아 나아갔다. 동네 어르신들이 나와서 구경하면 막걸리 통이 실려 나오고 술잔이 돌았다. 아마도 이장님이 한 턱 쏘는 모양이다. 마을에 홍수를 막으려면 현대식 방천을 만들어야 했다. 시래천 쪽으로는 가지런히 돌을 짜고 일정한 위치에 철망에 매우 무거워서 한 번에 한두 개씩밖에는 져 나를 수 없는 큰 버력인 ‘동돌’을 넣어 고정했다. 그 윗부분에는 잔디 심고 방천을 꾸몄다. 천 안쪽 논이 있는 곳으로는 잔디만 가지런히 심었다.
농사지어 놓은 논에 수확도 못하고 모두 물에 떠내려간 것을 기억한다면 방천을 빨리 만들어야 했다. 여름철 홍수가 나기 전에 완성해야 했다. 예전에 둑은 비뚤비뚤 제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생겨 있었는데 이제는 측량하고 스트레이트로 제방을 만들었기에 기분 좋은 신작로가 생긴 셈이었다.
새벽 아무도 모르게 짧은 바지에 셔츠를 입었다. 집에서 나와 방천에서 달리기 준비를 했다. 처음에는 잠깐 멈춰 서서 기초체력을 위한 순환운동처럼 가벼이 했다. 이제 3Km의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이 길을 왔다갔다 세 번하면 자그마치 9Km코스가 됐다.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마라톤이 있다고 해 미리 연습했다. 그런 덕으로 268명 중에 커터라인 100위를 해 그나마 부가점수를 얻었다.
먼저 동쪽을 향해 달리면 방천 안쪽으로 우리 묘답이 있었다. 홍수가 나서 떠내려 간 삭불(朔不)이의 집이 있던 곳도 지났다. 조금 달리니 동네 신지식인이었던, 1960년대 K상고를 나온 동네 형님 집 앞으로 지났다. 셋째형이 장사를 하던 조그만 초가 앞을 지났다. 곁에 철길에서 누워 잠자다가 팔다리가 절단 나서 절집 하는 동네 젊은이 집을 지났다. 우리 논이 있는 곳을 지나 동해남부선 울산 쪽으로 향하는 철교 앞이었다. 이곳이 반환점이었다. 다시 왔던 길을 돌아 숨을 몰아쉬면서 달렸다. 어언 집 앞쪽으로 달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면 그 옛날 손기정 선수처럼 되지 않을까 쓸데없는 걱정도 했다.
다시 달렸다. 중보(中洑) 방천을 따라가면서 달리니 둑도 연달아 같이 따라 왔다. 아랫마을 당수나무가 있었다. 상여집이 있었다. 삼굿을 하던 곳까지 오면 예전 우리 집에 세 들어 살았던 홈실댁 농장이 나타났다. 하천 둑 가까이에서 닭을 키우는 계사가 나타났다. 닭똥의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말았다. 그래도 달리던 길을 계속 달렸다. 아래시래, 보칠보(寶七洑) 머리까지 왔다. 보칠보에는 물이 많이 모여 있어서 도랑 폭도 꽤 넓었다. 다시 우리 집 쪽으로 방천 위를 달렸다. 길이 있기에 달렸다.
옛날 방죽에 제방을 쌓아서 방천이 되고나서 자연히 길이 됐다. 이제 아스팔트를 덮어 놓으니 자동차도 달리기 시작했다. 방천은 홍수가 나면 물도 막아 주고, 우리에게 편리하도록 길도 내 주었다.
요즘 자가용 타고 한 바퀴 둘러보았다. 시래 방천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그 옛날의 방죽도 생각나지만 길 위에서 그 옛날을 물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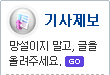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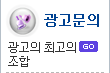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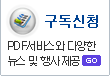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