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황성신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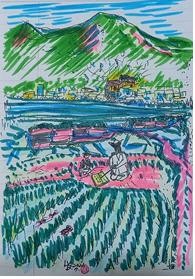 | | | ⓒ 황성신문 | |
다시 말해도 어린 날 삶의 궤적은 새삼스럽다. 누구는 경주 불국사를 평생에 한 번 와볼까 말까한 곳에서 어린 시절 두고두고 살아왔던 곳이라면 행복이라고 할까? 불행이라고 할까? 흔히 요즘도 질문을 받는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경주 불국사 기차역 앞인 데요.”
“아이고! 고향이 참 좋은 곳입니다.”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부러워하는 어투를 듣고 만다. 언연 중에 정말 나의 고향이 좋은 곳인가라고 골똘한 생각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서당이라는 곳을 다녔다. 그것도 공식적인 서당이 아닌 동네에 글 잘 하는 훈장이 계신 향촌서당이다. 훈장은 과연 선비라 할만하다. 사시사철 흰 버선에 백고무신 신고, 한복에 흰 수염 길게 기르고, 정자관을 썼다. 평소에 장죽 물고, 논둑 위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어 놓은 농사를 눈으로만 훑어보는 것이다. 논매기 철이 되면 절대로 논은 매지 않는다. 젊은 사위를 시켜 논매게 하고는 나무 짝 가래를 어깨에 겯고서 하릴없이 논둑만 맴도는 것이다.
서당이랍시고 가면 논둑에서 한문책을 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어제 배운 내용은 암송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서야 오늘 배울 것을 시작한다.
벼가 제법 자라 올라오면 초벌 논매기가 시작된다. 무논에서 참먹 개구리가 깨굴~깨굴 울고, 비 올 기운이라도 있으면 청개구리들이 갸갹∼갸갹∼거리고 한글 공부하는 것처럼 울어준다. 한자(漢字)를 한 자(字)씩 배우고 있으면 어느 새 참먹 개구리도, 청개구리도 그날 한문을 모두 깨쳤다고 깨굴~깨굴, 갸갹∼ 갸갹∼ 후렴처럼 또 따라 불렀다. 먼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짙어지며 낮의 후끈한 열기가 논벼 고랑사이로 지나면서 짙은 녹색의 볏 대가 저절로 내가 배운 한문 실력만치 쑥쑥 자라 오른다. 경주분지 위시래 벌판이 평야처럼 곡창은 못 되어도 집집마다 양식할 수 있는 쌀 생산지로는 적격이다. 분지의 가장자리에 있으면서도 분지 가운데처럼 흉내를 제법 낸다.
서당 훈장의 논은 일곱 마지기로 세 두락이다. 그 논의 모양새가 정사각형이다. 이 논에 대한 사연이 있다. 훈장이 불국사고장에서는 비록 과거는 못했지만 글줄을 했기에 천석꾼 집의 맏딸을 훈장에게 시집보내면서 주신 상답 일곱 마지기 논이라고 한다. 거기에다 앞산을 1정보 정도도 물려받은 재물이다. 훈장이 자급자족하고 살도록 한옥 한 채와 집에 딸린 채전(菜田)까지도 받았다. 시골에서는 후한 처가에 속하는 것쯤으로 기억한다. 흔히 동네에서 공부 잘한 사람으로 처가 재물을 받았다고 당신의 모범으로 부러워한다.
서당에 갔을 때 훈장은 벌써 연세가 꽤 되었다. 땔감 하러 훈장 사유지인 앞산 꼭대기에 올라가 풋나무해서 산골짜기 꼭대기에서 묶은 나무를 발로 차 버린다. 급격한 경사진 산골짜기로 통하여 산기슭 아래까지 나뭇단은 굴러 떨어져 도착해 있다. 멀리서 본다면 아마도 산꼭대기에서 백수노인이 도술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 얼마나 재미나는 광경인가. 훈장은 산기슭에 도착한 나무를 지게에 지고 그렇게 귀가해 땔감으로 사용한다. 아주 똑똑한 아들이 한 명 있었다는 데, 6ㆍ25전쟁 때에 납북(?)됐다고 한다. 또 고명딸 한 명이 있다. 딸에게 땔감을 해 오라고는 못하니까 손수 그렇게 나무하러 다닌다. 사위는 있어도 곧잘 불국사기념품 공장에 출근한다.
내가 서당 가게 된 까닭은 큰형과 두 띠 차이로 아버지의 철학이 있어서 한문공부를 하게한 것이다. 하도 궁금해서 여쭤 보았다.
“아버지! 왜 제가 서당에 가서 어려운 한문공부를 해야 합니까?”
“야야! 봐라, 네 큰형과 나이 차이가 있잖아. 축문, 제문도 써야 하고, 가문에서 사성(四姓)과 혼서(婚書)도 써야하는데 지금은 네 큰형이 하지만 나중에는 네가 받아 해야지.”
아버지 삶의 철학이 참 대단하다. 벌써 그때부터 후대를 생각하는 라이프 서클을 단단히 알고 있었다. 나이 차 많은 큰형 돌아가시면 내가 배운 글로 가문의 글을 이어 받아가라는 뜻이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안 보내 주어서 또 서당에 나갔다. 한석봉 천자문을 ‘지킬 수(守)’자(1/4, 250자)까지만 배우다 다 떼지도 못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해 다녔다. 또 초교 졸업 후 2년간 배운 한문책은 동몽선습(童蒙先習), 계몽편(啓蒙篇), 명심보감(明心寶鑑), 통감(通鑑) 등이다.
한문책 한 권을 모두 배우고 나면 아버지는 5일 장날 노점에 파는 책을 잘도 구해 오신다. 아버지 덕택(?)에 국문학을 하면서 한문은 상당히 덕(?)본 것이 됐다. 차후에는 고마웠지만 그때는 한문공부가 그렇게 싫어서 건성으로 시간만 때운 적이 많았다.
새보머리 둑에 밤알이 듬성듬성 보이는 가을철이 된다. 훈장님은 익어 가는 논벼를 친구삼아 논둑 가장자리 죽 늘어선 나무그늘에 앉힌다. 그렇게 한문공부를 시작하곤 한다. 완전히 노천학교에서 자연을 벗 삼아 배우는 자연학교이다.
한문공부를 하러 갈 때는 반드시 지게지고 가도록 한다. 어쩌면 아버지는 참 고마우시기도(?) 하다. 지게에다 한문책과 붓․먹․벼루까지 보자기에 돌돌 말아 얹어가게 한다. 서당공부한 후에는 바로 풀 베서 그 지게에 지고 오라는 것이다. 풀베기를 하루에 너~댓 번을 그렇게 해야 했다. 소가 많아서 풀은 베 오는 대로 모두 소먹이가 되고, 그나마 남으면 짚과 함께 작두에 썰어서 쇠죽 끓인다.
유년기의 체험을 찾아서 고향엘 오랜만에 찾아갔다. 이제는 모두가 변해 버렸다. 오로지 구순 넘은 둘째 형수만이 집 지키고, 나를 반겨 주었다. 훈장댁은 흔적도 없어졌다. 본래 시너대가 울타리가 되어 있었는데, 돌아가시고는 대나무에 하얗게 꽃이 피어 집이 몰락해 버렸다고 형수님이 곱씹어 알려 준다.
고향을 찾아간 저녁녘은 어둠살이가 시작하는 시간이다. 토함산 중허리에 저녁예불 드리는 ‘불국사의 종소리’가 나그네의 발걸음을 따라오며 은은히 흩어졌다가는 다시 모여 든다.
어릴 때 그 ‘불국사의 종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해 별로 낯설지 않다.
“디~이 잉~ 콰르르~릉! 디~이 잉~ 콰르르~릉!”
슬피 울어주는 불국사 쇠북의 저녁예불 종소리다. 어릴 때 익히 듣던 그 절의 종소리가 분명 정확히 맞다. 마치 환청처럼 다시 종소리가 연이어 울리어 오면 알지도 못할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어 나의 얼굴에 묻히고 만다.
온통 불국사 지역에 불국토의 기원이 가득하다. 옛 훈장은 간 곳이 없고, ‘불국사의 종소리’는 옛날과 다름없는데, 고향 위시래에 발걸음을 떼기가 무섭게 산그늘이 다가와서 어둠이 엄습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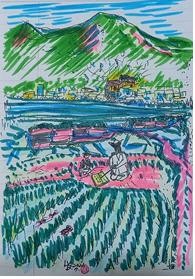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