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황성신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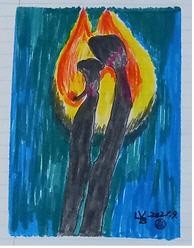 | | | ⓒ 황성신문 | |
인간이 태어나서 불과의 인연은 아주 중요하다. 불이 없으면 음식을 익힐 수가 없으며, 추울 때 시골에서는 난방 할 수도 없다. 세상에는 씨가 있다. 과거에 새댁은 시집을 와서 불씨를 꺼트리면 쫓겨나야 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불씨다. 그러나 이 불붙이는 실제 ‘불씨’ 말고 무슨 일을 하려고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불씨도 있다.
옛날에는 불 켜려면 쑥을 뜯어 말려, 비벼서 아주 보드랍게 만들어야 했다. 부싯돌은 비빈 쑥과 함께 들고 치면서 불을 일으킨다. 성냥이란 것이 생필품으로 나오고, 기름 넣고, 돌 넣는 라이터가 나오면서 더욱 편리해진다. 전자 라이터가 나오고는 그 편의성이야 말로 다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프리카 부시맨이 살았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불씨가 중요했다. 오늘날 너무 편하게 사니까 조금 전의 과거를 금방 잊고 사는 게 우리들이지 싶다.
불씨는 불 피우고 난 후에 화로에 불을 담아서 밤새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것이다. 아침에 밥하려면 성냥도 없이 화로의 불씨를 가져가서 불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엌의 불씨는 이렇게 붙여둔 것으로 재 덮어두어 종일 불씨가 된다. 다시 불붙이려면 꺼지지 않은 잔불에다가 종이나 보드라운 끄나풀이 들어가서 입김으로 불씨를 살려 낸다.
불씨 만드는 성냥을 과거에는 집에서 만들었다. 버드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껍질을 벗긴다. 속 버드나무를 낫으로 깎아 모았다. 깎인 버드나무는 양끝이 가늘었으므로 동그랗게 꼬부라져 말린다. 이렇게 버드나무를 계속 깎아 묶어 둔다. 시장에 황을 사온다. 화로에 사발 그릇을 놓고 황을 녹여 끓인다. 황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난다. 말려 둔 버드나무 깎은 것을 펴서 하나씩 앞뒤로 끓인 황을 찍어 둔다. 한 묶음씩 묶어 사랑채 방에, 큰 채 방에 비치해 둔다. 불을 켜야 할 때면 화로의 불씨에다가 마치 성냥처럼 황을 찍은 버드나무를 갖다 대면 발화한다. 이 얼마나 경제적인가? 성냥까지 사서 쓰지 않고, 황을 사다가 이렇게 성냥을 수제품으로 사용한다.
고향에서 성냥은 ‘다황’ 혹은 ‘다강’이라 한 것으로, 당(唐)나라에서 사들인 황을 녹여서 이렇게 성냥으로 만든 것이기에 ‘당황->다황->다강’이 됐다고 본다.
불씨! 옛날에는 정말 중요하다. 셋째누나가 한 번 불씨를 꺼트려서 아침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 서랍에서 몰래 부싯깃*(마른 쑥 등)과 부싯돌, 부시 철을 가져가서 부싯돌 쳐서 불 만든 적이 있다. 셋째누나는 그때 무척 고마워했다. 아버지에게 불씨 꺼트렸다고 꾸중 안 들은 것이 다행이기 때문이다.
또 들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담배를 피우려면 불씨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고 부싯돌을 계속치고 있다가는 담배 한 대도 못 피우고 시간만 모두 지나가 버릴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지시를 받는다. 쑥부쟁이를 베다가 잘 말려 두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야외로 나갈 때 불씨 만들려는 것이다. 부지런히 쑥부쟁이를 베다가 말려두면 무슨 대단한 것 만드는지 기다려진다. 잘 말려진 쑥부쟁이를 한 움큼이 되도록 죽 이어 나가면 아버지는 짚으로 밑에서부터 돌돌 감아올렸다. 약 2m정도까지 가서 끝내고, 묶어 둔다. 이러한 것을 계속 만들어 쌓아 둔다.
만들어 둔 쑥 횃대는 들판으로 나가 일할 때 돌돌 말아 묶어 둔 쑥부쟁이 서너 개를 들고 논으로 나간다. 쑥 횃대 끝에 불을 붙여 둔다. 혼자 계속 조금씩 타들어 가고 있다. 쉴 때마다 쑥 횃대에 붙여 둔 것이 불씨가 되어 담뱃불로 댕길 수 있게 된다. 말린 쑥부쟁이는 하루 종일 태워도 서너 개면 불씨로 충분하게 된다. 하나의 쑥부쟁이가 다 타기 전에 옮겨 붙여 두는 일은 내가 맡는다. 그러면 꺼지지 않은 쑥 횃대를 보고 아버지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기분 좋다.
부싯돌 사용에서 성냥이나 라이터가 나오고부터는 할일이 없어서 귀중품 서랍 속에서 그저 놀고만 있다. 이제 불씨라는 것도 사라지고 만다. 그저 마음의 불씨만 남아 있을 뿐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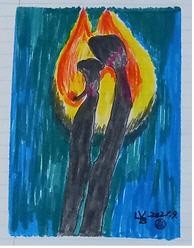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