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천수답의 물대기(2)
“인향 천 리 문향 만 리”- 이영백 수필가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15일(금) 13:44 입력 : 2022년 04월 15일(금) 13:44 
|
|
 |  | | | ⓒ 황성신문 |
|  | | | ⓒ 황성신문 | |
<지난호에 이어>
하늘도 하도 맑아서 별이란 별은 온통 내 눈 안으로 모두 쏟아져 내린다. 은하수가 가로질러 칠월칠석 견우·직녀가 만날 다리도 보인다. 가장 북쪽에 우뚝 보이는 북두칠성 1등 별들이 제 자랑을 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별, 자기를 보라고 말하듯 붙박이별로 떠 있다. 또 등불이 어른거려 보였다. 아까 내가 터뜨리고 내려왔던 그 물꼬의 논 주인이 자기 논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다시 확인하러 왔던 모양이다. 그 새 물꼬를 막은 흙을 터뜨리고 자기 논에 또 물을 댄다. 이때는 불도 켜지 않고 캄캄하게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확인 후 물을 대는 것이 상책이다.
논으로 무언가 지나갔다. 호~작호~작 방금 물 대어서 물이 들어 있는 논바닥으로 쥐가 지나가는지 제법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가로 지르는 소리다. 조금 있으려니까 웬걸 삵인 납닥발이가 모래를 막 퍼 부면서 지나간다. 이런 정황에서 어린 나로서는 간이 콩알만 해지고 말았다. 무섭다고 울 수도 없다. 그랬다가는 방금 나온 사람에게 들킬까보아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 무서움과 싸우고 있을 뿐이다. 이때는 정작 납닥발이 보다는 사람이 더 무서웠다.
자기 논에 물꼬를 틀던 그 사람이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보고 혼자 있으려니 무서워서 견디지 못해 등에다가 불을 밝혔다. 하늘 쳐다보니 벌써 삼경이 지나면서 초저녁에 본 은하수가 제법 움직여 있다. 지나가던 몹쓸 바람이 휙 부니 금방 등불 속의 호롱불이 꺼져 버린다. 무서웠다. 한밤이 되었으니 사방천지가 조용하다. 지나가는 바람들이 논의 모를 휩쓸고 허리가 휘어질 뿐이다. 마지막으로 물길을 우리 논으로 틀어 놓고 집으로 잠자러 돌아오고 말았다.
한밤 사립문을 열고 철커덩 철사열쇠 소리가 나면서 물대고 온 나의 흔적을 소리로 남겼다. 사경(四更)이 되었다. 피곤하였다. 잠에 빠져 들었다. 새벽 네 시면 아버지는 기침하신다. 아침에 이런저런 집안일을 확인하고 또 아침 여섯 시가 되면 논벌로 우리 논 둘러보러 나간다.
낮에 소 풀베기와 낙엽 긁어모으기 때문에 지친 몸에다 논에 물대기를 새벽까지 하고 와서 깊은 잠에 빠져 버렸다. 꿈속에서도 물대는 어른들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 터에 아버지의 소리에 그만 단잠을 깨고 말았다. 벌써 아침 일곱 시 반이었다. 아버지는 모든 논을 다 둘러보고 간밤에 물을 어디어디 잘 대고 들어왔는지를 조사 완료하고 오신다.
“막내 너 어제 밤에 물 안 대고 어디 놀러갔다 왔제?”
“예? 어제 제가 논에 물대고 사경에 집에 들어 왔습니다.”
“묘답 다섯 마지기 논에 물이 하나도 없던데?”
“예. 저는 어제 밤에 분명히 물대고 왔심더. 언제 제가 거짓말 합디까?”
“그래? 이상하다 말이야. 알았다. 어제 밤에 물댔으면 오늘 낮에 모가 시드는지 안 시드는지 보면 알끼다.”
“예. 저는 분명히 물 댔심더.”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밤새껏 물대고 새벽에 들어 왔는데 그 물은 어디로 갔을까? 너무나 억울해서 넷째 형님에게 여쭤 보았다.
“형, 간밤에 분명히 물 댔는데 그 물은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그래 알지. 그 논은 천수답이고, 물은 댈 때 붙어 있지. 물 안대고 때면 금방 말라버려. 니 그것 아직 몰랐구나?”
아하! 이제야 원인을 알았다, 아버지는 그것을 아시면서 일부러 나에게 테스터를 해본 것이다. 그날 묘답 다섯 마지기의 모는 싱싱하였다.
* 납닥발이 : 삵. 살쾡이〔夜猫〕
|
|
|
황성신문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최신뉴스 최신뉴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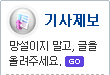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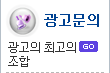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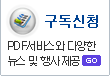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