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향 천 리 문향 만 리”- 이영백 수필가
내 고향이 그리운 것은 (1)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22일(금) 14:49 입력 : 2022년 04월 22일(금) 14:49 
|
|
 |  | | | ⓒ 황성신문 |
|  | | | ↑↑ ▲ 내 고향이 그리운 것은… | | ⓒ 황성신문 | |
고향이 있다. 가고 싶은 고향이 있어서 좋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사연이 있는 고향이 더욱 그립다. 고향이 그립고 그리운 것은 자꾸 그립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그리울 수밖에 없다. 고향이 그리워도 아예 못가는 사람들의 고향도 있고, 나이 들어서도 자주 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
고향은 고향을 오래 나가 살았던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고향은 어릴 때부터 고향을 지킨 사람을 좋아한다. 그 동안 고향을 자주 찾지 않아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냥 그곳을 스쳐지나 가는 나그네이다. 무슨 함수관계가 있을까? 고향이 싫어할 것이 분명하다. 나그네는 깊은 인연이 없기 때문에 고향은 나그네를 분명 싫어하고 말 것이다.
인간에게 고향은 참 따뜻하다. 고향이 따뜻하다는 것은 고향을 그만큼 사랑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고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고향은 주체가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그지없다. 고향을 고향으로 사랑하려면 따지는 것이 너무나 많아진다. 그래서 고향을 알아야 한다. 태어나서 안태본이 된 것으로부터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
고향의 자연, 걸음마를 할 때부터 고향의 흙내음도, 방죽의 수양버들이 휘늘어졌던 것도, 갱빈의 금빛 모래알 하나까지도 말이다. 동네를 가로 지르는 도랑물, 거랑, 자연으로 굽어져 만들어 진 인간이 다니는 길, 피리 불던 언덕도 있다. 긴 보리밭 따라 보리피리 불던 일, 일 년 사시사철 고향 세시(歲時)도 하나하나 들추어가면서 추억을 골라낸다. 뻐꾸기, 꿩 한 마리, 산 노루, 고라니, 보리밭 고랑 사이의 종달새도 있다. 도랑물에 꼬리치는 버들치, 다 자란 논벼가 있는 골 사이로 농병아리가 어미와 새끼하고 아장아장 걸어간다. 뜸~뜸~! 뜸 들이는 뜸부기도 있다. 자연 속에 놀았던 그 때 그 자연의 동영상을 나는 아직도 간직하고 산다.
어릴 때 배고파서 한 밀 서리로 재미를 내면 안 되겠다. 삼박골 밀 서리는 추억이 아닌 살기위해 밀 서리한다. 물론 변명이겠지만 시계가 없던 시절 용케도 시간을 맞추어 약속도 한다. 혼자 보는 배꼽시계도 분명 시계 축에 든다. 지서의 오포(午砲)도, 교회의 푸른 새벽 종소리도 시계다. 동해남부선 레일 위를 달리는 증기기관차도 시간을 알려 준다. 게다가 집에서 방사하는 닭들도 시간을 알려 준다. 간혹 대낮에 함부로 울어대어 그 정한 시간을 떠나 집에서 닭을 많이 키운다는 정도로 인식하게 한다.
상수도 없던 시절 우물을 파야 한다. 먼 산, 중간 산, 가까운 산에 나무 하러 가는 사람들도 잘도 나누어 끼리끼리 유유상종한다. 점심도 도시락이 아닌 초백이에 싸온다. 반찬이 겨우 고추장 종지기 하나만 들어있는 초백이 도시락이다. 그러나 그 초백이 밥 먹고, 송기 꺾어와 송기떡을 만든다. 땔감나무하기에도 바쁜 봄이면서도 진달래 꽃방망이를 만들어 오던 여유가 있다. 누가 이런 농촌문화의 추억을 거침없이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고향 못에는 물도 채우기도 하지만, 날 가물면 물 말라서 “고기떨이”도 하였다. 아기만한 잉어의 휘 굽어진 수염에 새삼 놀란다. 민들레 잎처럼 생겼지만 진짜 톱날 같은 말밤쇠는 지금도 발바닥을 아리게 한다. 토하(土蝦)는 민물새우로 뜨거운 열만 보면 붉어져서 보기에도 좋지만, 그 맛 또한 애호박과 어우러지면 시골의 어떠한 음식의 맛보다 맛이 돋는다.
<다음호에 계속>
|
|
|
황성신문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최신뉴스 최신뉴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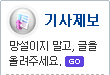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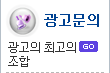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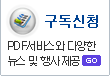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