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자잉고 배워 타다 못에 빠지다 | | ⓒ 황성신문 | |
 |  | | | ⓒ 황성신문 |
동네에서 자전거 보기도 힘든 시대였다. 윗시래에 한 부잣집 어르신이 한복 입고, 갓 쓰고 자잉고를 타고 다닌다. 편리한 듯 보였는데 모습은 참 어울리지 않게 난처하다.
당사자는 신문명기구 탔으니 긍지를 가진다.
자잉고 타는 것 배우기도 어려웠다. 어린아이가 신문명기구를 탈 수도 없다. 초교 졸업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서당 다니던 시절에 한 살 아래인 둘째형 큰아들인 조카가 놀러 왔다.
“삼촌, 자잉고 탈 줄 알아요?” “아니, 어찌 그러한 물건을 탄단 말인가?” “하하하…. 인자 와서는 자잉고 타는 것쯤은 배워 둬야지요. 알았어요. 기다려 봐요.”
조카가 역전에서 종일 빌리는데 삼십 원 주고, 자잉고를 빌려 왔다.
동태 두 개만 달린 희한한 괴물을 어찌 탈 수 있을까?
그런데 동네가 하도 좁아서 자잉고 배울 곳도 없다. 하기는 마당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데 어디 일 안하고 아버지 앞에서 자잉고 배우다가는 경을 칠 일이다.
“삼촌! 거랑에 가자. 트럭 다니던 길에 자갈이 잘 다져져서 배우기에 좋겠다.”
긍정도 부정도 없이 그냥 따라 나서고 말았다. 물론 조금 호기심도 있었다.
거랑바닥에 난 트럭 다니던 그 길에서 자잉고 위에 올라탔다. 비틀거리면서 중심 잡았다.
“삼촌, 뒤돌아보지 말고 페달 밟고, 조심하고, 다치지 말아요.” “응.” 운동에 젬병인데 페달을 저었다. 처음에는 비틀거렸다. 뒤에서 조카가 붙들어 주어서 넘어지지 아니하였다.
오전 내내 거랑 길 위에서 페달 밟으니 용케도 안 넘어지고 앞으로 내달릴 수 있다.
“아직 안 놓았제?” “하하하…. 벌써 놓았지요. 그래 타면 됩니다. 인자 혼자 타이소!” 조카는 그만 가 버렸다. 혼자 제법 기술을 익혔다. 이제 자신이 붙어 아래시래로 나갔다. 다시 돌려 역전으로 올라갔다. 다시 회전하여 조양 못 곁에 비탈진 길로 내려왔다.
혼자 타고, 내리고 페달을 밟기 시작해 신이 났다.
비탈길로는 핸들만 잘 잡으면 되었다. 길 가운데 툭 불거진 돌에 그만 부딪혀서 공중으로 날았다. 조양 못물 속으로 직행했다. 물을 잔뜩 먹었다. 죽는가 싶었다. 그래도 살았다.
시래천 하상바닥 자갈길에서만 탔으면 괜찮았을 것이다.
기량 늘었다고 비탈길 편안히 내려오다가 물속에다 처박아서 죽다 겨우 살았다.
그런 후 자잉고 트라우마(trauma)가 생겼다. 자잉고는 자전거의 경주 사투리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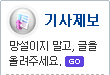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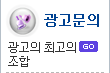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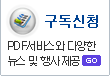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