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마음속의 감꽃도 사라졌다 | | ⓒ 황성신문 | |
 |  | | | ↑↑ 대구 한비수필학교장
명예문학박사
수필가 이영백 | | ⓒ 황성신문 |
나는 감나무의 감꽃을 좋아 한다. 아버지는 전근대농업시대에 태어나 농업에 대한 생활을 지속하며 살았다. 내가 태어난 집에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집으로 이사 와서 살게 되면서 차츰 집안 내력을 알게 되었다. 새로 살러가는 집집마다에 감나무를 심거나 심겨져 있었다. 그 깊은 뜻은 늘 아버지의 생각이다.
최초 기억으로 첫 번째 집은 할머니가 살았던 앞집이다. 할머니 집 너머로 우리 집 감나무가 자라 가지가 쳐졌다. 그곳에 잔 감이 많이 열리었다. 종형이 곧잘 감을 따 먹어도 괜찮았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장질이니까.
두 번째 집에서는 고목이 있었다. 사립문 입구에 감나무가 있어서 “감나무 집”으로 통하였다. 셋째 형이 칠 년 군대생활 하였기에 엄마가 부산 김해 공병부대를 찾아가려고 그 감나무 베어 팔아 여비로 장만하던 것을 보았다.
세 번째 집에서는 동서남북 담장마다 감나무가 서 있었다. 온통 감나무로 집을 보호하는 듯하였다. 그랬다. 감나무는 시골에서 살림밑천이다. 해마다 감꽃이 피면서부터 모내기가 시작 된다. 감꽃이 떨어질 때면 귀리의 기다란 훼기를 뽑아 감꽃 꿰어 감꽃목걸이를 만들고 놀았다. 가을철이면 바구니마다 붉은 감들이 따 모아지고 팔리어 나가면 돈이 된다. 늘 감나무에서 생산되는 수입은 어머니 몫이었다.
네 번째 집, 집둘레에 생나무 울타리는 물론이고, 사천여 평 밭둑의 가장자리마다 감나무가 즐비하게 심기어졌다. 용돈이 필요해 기다리지 못한 어머니는 비록 푸른 감인 감또개*를 주워 모아 삭히어서 팔았다. 감이 붉기 시작하면 먼저 햇볕을 받아 잘 익는다. 홍시가 먼저 나오기 시작하였다. 바람이 불어도 감 따는 날에는 우리 집 감이 썩 좋다고 울산에서 상인들이 조바심하고 서서 기다렸다. 먼저 좋은 감을 사려고 그랬나싶다.
감나무는 본래 시조가 고욤나무이다. 감나무 싹을 구해 와서 고욤나무 지주에다 접붙이기를 하여 접붙이기로 불려 나갔던 것이다. 들은 얘기로 큰형이 일제침략기 시대 때 밤에 군대 차출되는 것을 감나무가 막았다. 밤 되면 감나무 위에 올라가 몸을 피신하여 징집 피했다고 하였다. 감나무가 사람 살렸다.
그렇게 나의 평생 동안 따라 다니던 감나무가 있는 집을 아버지 연세 들고. 큰형 집으로 합가하면서 팔아버렸다. 팔린 집에서는 감나무가 베어졌으므로 감꽃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고향을 찾을 때마다 감꽃이 자꾸 생각났다. 못다 핀 감꽃이다.
-------
*감또개 : 꽃과 함께 떨어진 어린 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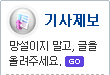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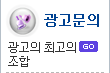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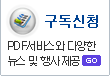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