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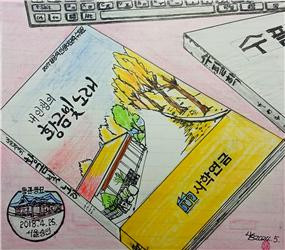 | | | ↑↑ 「내 인생의 황금빛 노래」에 글 싣다 | | ⓒ 황성신문 | |
 |  | | | ↑↑ 대구 한비수필학교장
명예문학박사
수필가 이영백 | | ⓒ 황성신문 |
난 늘 잡문만 써댔다. 입학식, 졸업식, 누구의 책, 무슨 단체에서 발간하는 책의 서문, 심지어 누구 아들 S대학교 가는데 “자소서” 등 그렇고 그런 글만 써댔다. 심지어 친구가 “수필집”을 내는데 교정봐 달랜다. 그것도 짧은 몇 시간 만에 책 한 권 교정을 모두 보아주었다. 글을 왜 나에게 써 달래지? 아니면 왜 나에게 교정을 봐 달래지? 나는 로봇처럼 글 쓰는 사람인가 보다.
초등학교 교사 때에는 고학년 담임을 거개 맡았다. 다섯 군데 근무지마다 마지막 6학년 담임을 맡았다. 마지막 근무지에서는 1개월 25일 만에 퇴직하였으니 그렇다 치자. 네 군데 근무지에서는 졸업식 송사 쓰는 것을 꼭 나의 몫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 세 번째 학교에서는 학급신문, 졸업문집까지 발간하였다. 고향에서는 “경주교사 아동문예회”모임에도 활동하여 보았다. 나중에 그 곳에서 시인과 수필가가 여럿 배출 되었다.
직업을 바꾸어 공업전문대학 교무행정(교육행정가)을 맡았다. 개교기념식, 졸업식, 입학식 등 무슨 행사 때마다 인사말 쓰기가 나에게 떨어져서 쓸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글 쓰는 곳에서 필요하다면 나에게 꼭 그 글을 쓰게 만드는 모양이다.
그래. 나도 언젠가 시간이 난다면 시나 소설뿐만 아니라 무슨 장르에서든 내 글을 쓰는 문학인이 되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살았다. 21세기가 되면서 조직이 복잡해졌다. 대학행정에도 환멸을 느꼈다. 정년 3년 두고 두말없이 만57살에 그만 은퇴하였다. 그렇게도 양어깨가 가벼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퇴직 3일 만에 너무 무료해지기 시작하였다. 좋아하던 술을 마셨고, 도시에서 이웃사촌들과 근교 등산도 다니면서 퍽이나 술을 즐겼다. 남는 것은 건강 손실뿐이었다.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았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였다. 남은 나의 생애에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찾아 나섰다. 그것은 바로 글쓰기이다. 시골에서 생활로 출발하여 나의 체험 풀어내는 일, 초교 교사시절 등 젊은 날 기억을 소환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자질구레하지만 즐겁게 다듬어 써 내려갔다. 3년간 한밤 잊어버리고 아래층 누옥 골방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자꾸 글을 써댔다.
초임 모포초교는 「파도소리에 묻혀」, 두 번째 내북초교는「산골짝에 다람쥐」, 세 번째 감포초교는 「파도치는 등대아래」, 네 번째 괘릉초교는 「왕릉 숲속으로」 등 그 책 제목이다. 7년 10개월 교사생활에서 250여 편을 마구 쏟아내었다. 이 중에 일곱 편 골라 수필가로 등단하고, 3년간 이론공부를 더 하였다. 이제 한비수필학교를 만들고 “수요일愛수필쓰기반”을 운영한다. 인생 이모작 짓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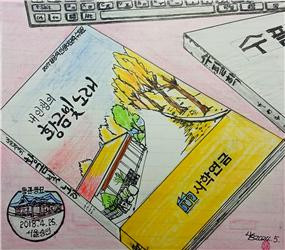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