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폐역 되었으나 근대역사 건물로 보존한다니 다행이다 | | ⓒ 황성신문 | |
 |  | | | ↑↑ 대구 한비수필학교장
명예문학박사
수필가 이영백 | | ⓒ 황성신문 |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산다. 요즘은 자가용 타거나 직행버스 이용 후 시내버스 타고 고향에 간다. 예전에는 즐겨(?) 탄 것으로 기차밖에 없던 시대도 있었다. 더 예전에는 시내버스도 없었다. 버스라는 말은 “모두를 위한”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이다. 고교 때 합승버스인 작은 “옴니버스(omnibus)”가 있었다. 세월 거쳐 오는 동안에 이제는 기차 탈 일 없이 살아간다.
밤마다 고향의 새벽이 열린다. 새벽 네 시 고향의 두 군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린다. 동해남부선 불국사기차역의 기적소리 들으며 잠이 깬다. 시골에는 일찍 깨어나서 부지런히 자기 삶을 챙기며 살아야 하였다. 불국사기차역 속으로 쥐방울처럼 자주 들락날락거렸다. 또 그곳을 통하여 마음대로 건너 오가고 살았다.
삶에서 그 곳은 다시 찾아볼 줄 알았던 불국사기차역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국내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은 평생 한 번의 소원을 이루는 것처럼 “불국사”로 기차 타고 오곤 하였다. 그 시대 기차시간표 맞추려고 무던히 애썼으니 고향 사람으로서는 더욱 고맙게 느낀다. 기적소리 자주 듣고 살았다.
언제부터인가 꼭 실행하려 했던 기차여행을 자꾸 생각만 하고 살았다. 기차간 속으로 이동하던 홍익회 아저씨들은 외쳐댄다. “땅콩 사려! 맥주가 왔어요! 계란, 김밥이 있어요!” 그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소리치던 기차간이 지금도 귓전에 바로 들리듯 쟁쟁하다. 그 때는 그러한 소리 듣고 사는 일이 일상인 줄 알았다.
관광지 고향 불국사기차역을 그 시절로 가서 들여다본다. 슬픔도, 기쁨도 그곳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오가는 승객들이 복작인다. 저 만치에서 낡은 기둥시계처럼 오래도록 시간 지키려는 듯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 검은 테 모자 쓴 역장은 부지런하다. 평소 화초 가꾸고, 시간 잘 지켜 사고 없이 기차, 화물기차를 통과시킨다.
어느 샌가 눈 내린 기차역에서 소곤거림이 들려온다. 외지인들이 그래도 오늘까지 찾아오던 고향 기차역이다. 레일 위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 쌓이었다. 기차가 지나간 지 오래다는 증거다. 길고 긴 평행선은 고단한 우리네 삶을 말하는 듯하다. 시린 손가락 녹여서라도 고향 기차역을 퍼 담아두려고 휴대폰의 셔터 눌러댄다. 이 철로는 1918년에 경동선으로 영업하고, 최초 역명은 “소정역”이었다. 1936년에 신 역사 짓고 85년간 사용하였다. 2021년 12월 28일 불국사기차역이 폐역 되었다.
떠날 때 성공을 손가락으로 걸며 헤어졌던 고향 기차역에서 오늘도 내가 주인공처럼 홀로 서서 이별의 푸른 애수를 더듬는다. 그것이 차마 샤강의 눈 내린 마을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시끌벅적하던 대합실은 너무 조용하다. 고향역이 폐역 되었다.
그 앙큼한 경제논리로 기찻길이 철거하여 너무 아깝다. 추억의 흔적인 흰 눈 내린 고향 불국사기차역에서 그 애처로움이 눈으로 펑펑 내린다. 아예 쏟아진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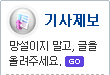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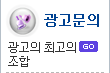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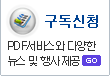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