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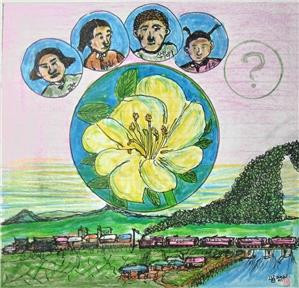 | | | ↑↑ 옛날의 고향 풍정 | | ⓒ 황성신문 | |
 |  | | | ↑↑ 대구 한비수필학교장
명예문학박사
수필가 이영백 | | ⓒ 황성신문 |
과꽃 피는 7월이 오면 내 고향 남도 이백 리 길 멀다않고 찾아간다. 초가지붕 위에 하얀 박들이 뒹굴고, 어둠 내리면 박꽃이 나를 반겨 주던 곳이다. 이제 그 아련한 풍정은 사라지고 없다. 은어처럼 귀소성 때문에 반겨 주는 이 없어도 고향 찾는 습관이 배었다. 고향, 이제 말만 들어도 귀까지 즐겁다.
내 고향은 전 국민이 모두 알 수 있는 경주불국사 사하촌 불국동(시래)이다. 글을 써다가도, 멍 때리기 하다가도 조요한 고향이 아리도록 그립다. 차라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시골 버드나무 정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던 것은 나 혼자만이 그런가? 시골 풍정, 그것이 자꾸 다가온다. 가고, 또 가고 찾아가도 지겹지 아니하다.
화려한 도회지 조명 속에서 간혹 고향 생각하며 꿈을 꾼다. 비록 초가지붕 밑에 살았어도 대소가 췌객들이 모여 밤낮으로 화전놀이하고, 꽹과리소리 울리며 장구로 장단 맞춘다. 둘째형 가장 잘하는 “성주풀이”가 구수한 곡조로 조그만 마을에 울려 퍼진다. 두루 어울려 놀면 이웃집 할머니 기장댁이 덩달아 구경 나들이로 찾아온다. 동동주 잔 가득 부어 드리니 인심도 좋다. 우리 집 충견 복실이와 라시도 그날따라 컹컹 부드럽게 짖어 주어서 그 소리 많이도 후하다. 안 그러면 집 앞에 얼씬도 못하게 짖는다. 저절로 지금도 나타나는 고향 활동사진이다.
조용히 다시 눈 감는다. 금자, 봉화, 삭불이, 애자 등 소녀ㆍ소년들의 이름이 정겹다. 언제나 후한 얼굴의 금자도 이제는 나이가 많겠지. 앵앵거리던 봉화도 어디로 시집가서 잘 살겠지. 사라호 태풍으로 집이 통째로 홍수 속에 떠내려갔던 삭불이 친구도 저네 큰형 은빛 대위 계급장 달고 부산에서 찾아와 떠나가 버리고는 이제껏 소식 모른다. 언제나 몸이 약했던 가녀린 애자도 어디로 시집가서 잘 살겠지. 나의 글 속에도 자주 등장하는 계집애, 머슴아들이 무척 그립구나. 이제라도 보고 싶구나. 마음의 고향에서 발길이 가볍다가 무겁다.
그리운 어린 나날들이 보인다. 낮이 긴 날 봄이면 가장 먼저 참꽃 따 먹고, 그래도 배고프면 찔레 순 꺾어다 허기진 배를 채웠다. 여름 오면 오디 따고, 가지 따다 먹으며 굶주림을 이겨내었다. 가을이 오면 감나무 위로 올라가 홍시 떨어 먹던 그 날의 맛이 새로이 밝다. 겨울 오면 초가지붕 밑에 플래시 비춰 참새 잡아 한밤에 여럿이 옴 밥 해 먹었다. 어찌도 그날들이 이리 아리고, 그리운가?
어찌 나는 이제 고향 찾은 늚이로 나그네가 되었는가? 내가 유치한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에는 풋풋한 여학생들이 왁자지껄한 운동장을 독차지하고 공놀이한다.
고향, 고향을 찾았지만 남천 시래거랑에 사행천, 굽이굽이 물만 흐른다. 노란 달맞이꽃대만 환영한다. 오늘 온 김에 밤 오기 기다려 달맞이하고나 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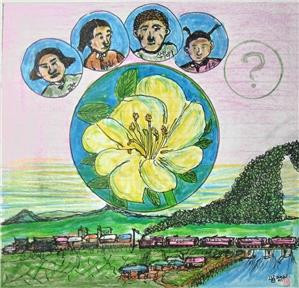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