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하필 이름이 코딱지 나물인가? | | ⓒ 황성신문 | |
어린 날 우리 집은 들판 속에 살았다. 논으로 이어져 있는 들판 속에 용하게도 아버지는 작은아버지와 의논하였는지 나는 모르지 만 밭 사천여 평씩 나누어 소유하였다. 가운데 밭둑에는 우리 집 뽕나무를 심어 밭의 경계선이 되었다.
봄이 왔다. 아무런 감각도 없이 겨우내 움츠려 있다가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봄이 왔다. 도랑물이 가장 먼저 돌돌~ 흘러가면서 봄을 알려 주었다. 도랑둑에 노랗게 빛나는 우리나라 토종 들꽃은 언제 들어도 이름이 너무 예쁘다. 패랭이, 바람꽃, 봄까치꽃, 지치, 노루귀, 괭이눈, 별꽃, 붓꽃, 꽃다지 등 수두룩하게 봄을 찾아온다. 어린아이도 찾아온 봄에 어울려 함 즐겁게 논다.
고향에서는 꽃다지를 “코딱지 나물”이라고 불렀다. 원래 꽃다지는 우리말 “-아지”에서 보여주듯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등으로 본래 것보다 작은 것에 붙여진 이름이다. 코딱지 나물이라 불리는 “꽃다지”도 다 자라봐야 20cm 전후밖에 안 되니 그렇게 이름을 붙였나 생각 된다.
꽃다지에서 “-다지”는 오이나 가지 등의 맨 처음에 열린 열매를 말하기도 한다. 또한 이름에서 보면 봄에 가장 먼저 꽃 피어나게 한다는 속뜻도 있다. 추운 겨울을 지속적으로 참아 오다가 연한 연두색으로 줄기를 버겁게 키워서 겨우 줄기가 형성되었다. 봄이라 하여 저도 모르게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 만 것이다. 자연의 드넓은 들판에 마음껏 자라서 우리들에게도 힘이 되려는 듯 생명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그것이 자연의 힘이다.
어찌 보면 엄마의 극성이라 할 정도로 봄을 가장 먼저 느끼려고 꽃다지 “코딱지 나물” 윗부분인 순을 잘라 와서 지글지글 전 부친다. 기름 냄새 그윽하게 마당에 퍼지면 우리들은 저절로 코를 벌렁대며 배고픔 달래려고 찾아든다. 접시마다 코딱지 나물 전을 부쳐 사랑채, 큰 채, 그늘진 마당 귀퉁이에도 멍석 깔고 전을 먹는다. 온통 집안 가득 전의 냄새를 퍼뜨린다.
오늘도 엄마의 부지런함에 코딱지 나물 순으로 전 부친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가장 빠른 봄의 전령사인 코딱지 나물 전으로 만났다. 입 즐겁게 오물거린다.
배추흰나비가 봄 알리려고 날개를 팔랑거린다. 마당에 삽살이도 꼬리만 흔들다가 엄마가 전 부치는 것에 자기도 거들어 보려고 멍석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황소는 봄의 기운을 느꼈는지 힘찬 소리로 한 번 크게 울어준다.
그래서 봄은 꽃다지인 코딱지 나물 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꽃다지 순에서 훌륭한 먹거리로 가장 먼저 전을 부쳐서 우리 가족들 봄 사랑을 퍼뜨렸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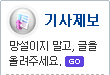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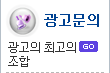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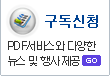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