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모내기 하는 날 들밥 먹다 | | ⓒ 황성신문 | |
 |  | | | ↑↑ 대구 한비수필학교장
명예문학박사
수필가 이영백 | | ⓒ 황성신문 |
논농사를 많이 짓던 우리 집은 늘 바쁜 일상의 농촌이다. 숙형, 계형과 머슴 셋 등 아버지는 집 지어 여덟 채 세를 주면서 한 달 살고, 하루 일을 요구하였다. 그 일꾼만 여덟이다. 일 년 열두 달 곱하기 여덟 명의 일꾼이 생긴다. 또 들판 가운데 살았기에 예전에는 과객들이 보통 네다섯 명이 되었다. 매일 일꾼들이 열 명에서 예닐곱 명이니 사람들이 농사짓는 일에 바글바글하였다.
모내기 철이 다가온다. 숙형과 큰 머슴은 매일 논갈이에 진력 다 한다. 황소, 암소들은 차례로 무논과 마른논에서 쟁기를 메운다. 무논갈이에는 황소가, 마른논 갈이에는 암소들이 동원된다. 도랑 따라 물이 내려와 우리 논으로 콸콸 쏟아 들어간다. 논에 물 잡아 두었다. 물이 곧 부자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아버지는 비 오는 날 알아맞히듯 하여 모내기 날을 받는다. 소한들, 가너빠지기, 박석골, 아래시래, 위시래, 소전거리, 집 앞 등 논 위치에 따라 모내기 날이 줄줄이 정해졌다. 게다가 놉도 며칟날 미리 잘 꼰아 둔다.
가장 먼저 모판에 피사리 거친다. 남자들은 빈 지게를 모판에 뒤로 누인다. 그곳에 엉덩이 붙이고 새벽부터 모를 쪄낸다. 여성 일꾼은 요강 받치고 앉아 모를 찐다. 일하는 날 오전 나절 새참, 점심, 오후 나절 새참으로 끝이 나면 저녁은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 대접한 후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마침내 가장 논이 많은 아래시래 무논에서 모심기가 시작되었다. 오전 새참에는 칼국수와 막걸리, 점심에는 들밥을 준비한다. 들밥은 들에서 밥 먹는다고 줄여서 모내기 철에 “들밥〔野食〕”이라고 한다. 우리 집 들밥은 유난하다. 엄마는 일 년 농사에서 가장 요란하게 아래시래 들밥을 준비한다. 많은 이 먹는다.
우선 고슬고슬한 쌀밥 짓는다. 다슬기를 고향에서는 “사고디”라 하여 물 마른 도랑에서 잡아 정성껏 손질하여 국 끓인다. 새파랗게 우러나와 가장 맛 나는 영양국이 된다. 가죽, 두릅을 삶고, 토종 갈치를 잘라서 애호박 밑에 깔고 찌진 반찬을 만든다. 멸치와 무 썰어 넣어 환상의 조림 반찬이 된다. 풋고추 썰어 적당히 반죽하여 장떡이 나온다. 이 외에도 갖은 반찬이 진수성찬으로 준비되어 머리에 이고, 양손에 들고, 모심는 논을 향해 줄지어 나른다. 이 또한 들판에서 구경하는 것이 장관이다. 덤으로 동동주 담아서 술 단지 채로 머슴이 지고 간다.
한 해 농사를 위한 들밥은 최고의 화려한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들판에서 식사가 시작된다. 길손도 침 흘리기에 함께 먹는다. 들판에는 봄 제비가 비행 연습을 하듯 비켜난다. 하늘에 붉은 고추잠자리들이 작은 헬기로 비행한다. 들밥이 꿀맛이다. 우리 집 들밥은 해마다 기다려진다고 넉살 좋게 동네 분이 말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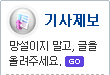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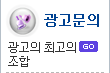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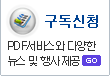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