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엄마와 나의 동디깨비 놀이 | | ⓒ 황성신문 | |
글자 모르는 엄마와 아버지와 살았다. 나는 시골에서 열 번째 막내로 태어났다. 어린 날에 네 번째 집으로 이사하였다. 녹색 들판 속에 동그마니 초가만 있는 곳이다. 네 채 속에 숙형, 계형과 셋째 누나와 함께 그렇게 살았다. 머슴들은 큰 머슴, 중 머슴, 꼴머슴 등도 함께 살았다. 그렇게 농촌에서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은하수 쏟아지는 밤하늘 바라보며 살았다. 오늘날로 치면 나는 완전 자연인이다.
친구라고는 아무도 없다. 마당에 커다랗게 정사각형 금 그어 놓고 손 한 뼘 크기로 내 집과 상대편 집을 만들었다. 어디서 병뚜껑 하나 주워 와 그것이 놀이도구인 것처럼 게임 시작하였다. 내 집에서 엄지로 검지를 붙들고 선 넘지 않도록 튀기면 병뚜껑 착지점에 꼬챙이로 선 그어 내 집이 확보된다. 반대로 상대편 집에서도 똑같이 집 확보하는 방법으로 땅따먹기를 혼자하고 놀았다.
그래도 심심하면 혼자 노는 방법을 또 생각한다. 요즘은 흔한 종이도 예전엔 없어서 진흙을 펀펀하게 골라놓고 낫 끝으로 그림 그렸다. 그림은 홍수 나서 국도 다리가 무너지면 크레인이 와서 공사하던 모습이다. 그것을 재미나 하였다.
겨우 윗동네 동사마을에서 친구 둘 있어 만난다. 풀 베다가 비석 치기 한다. 이기면 풀 한 아름씩 상대편 풀 챙겨가는 그런 내기 하며 놀았다. 비석 치기는 저만치 먼저 선을 긋는다. 그 선위에 내 돌을 세워 놓고 반대편 선에서 뒤로 돌아 돌 던져 세워 놓은 돌 넘어뜨리면 이기는 게임이다.
내가 살았던 동네에는 친구가 없다. 아침이면 용보(龍湺)에서 흘러 내려오는 미지근한 물에 세수하고 하루를 시작하였다. 아무래도 친구가 없다. 나와 꼴머슴은 소 풀 베러 다녔다. 그것도 짬 내어 아버지 울력으로 서당에 다녔다. 서당 공부 15분이면 그날 교육과정이 끝나 혼자 할 일이 없다. 그래도 시간 남으면 앞산 밀개산에 올라가 낙엽 그러모았다. 이를 가마니에 차곡차곡 넣어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것이 자연 속의 풍광이 되었다.
혼자 집에 있으려니 엄마도 미안해하였는지, 나와 동디깨비*하자고 하였다. 소주 병뚜껑 모아 밥그릇하고, 사금파리 주워 와서 살림 도구 하며, 납작한 돌 주워 모아 가구처럼 활용하였다. 머시마가 혼자 노는 데 부족하다고 엄마까지 동디깨비 같이하며 놀았다. 모자가 어울려 동디깨비 놀이 하였다.
소녀가 없어서 소년으로 그렇게 푸른 하늘 바라보며 들판 속에서 외롭게 살았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 소년에서 청년으로 살았다. 그 소년이 자라 동디깨비 하듯 오늘날 수필 쓴다. 엽서 수필을 쓴다. 보랏빛 “엽서수필”쓴다.
-----------------
*동디깨비 : “소꿉놀이”의 경주 사투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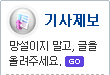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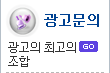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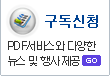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