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토함산 아래 영못의 말밤쇠 | | ⓒ 황성신문 | |
시비 안 오고 날 가무는 여름이 되면 문득
그 일들이 생각난다. 예전에는 저수지가 잘
없었다. 그러나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영못
〔影池, 그림자 못〕에서는 진흙 바닥에 묻
혀 있던 “말밤쇠”를 캐냈던 일이 생각난다.
배고픈 시절이라 못 진흙 바닥에서 캐낸다.
딱딱한 껍질 벗기고, 새하얀 알맹이를 발겨
내던 시절의 추억이 서리어 있다.
본래 이름이 마름의 열매인데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불린다. 물에 있다고 “물밤”, 말
줄기에서 달려있다고 “말밤”, “말뱅이”, 우리
고향에서는 철조망의 갈고리의 쇠처럼 생겼
다고 하여 “말밤쇠”라고 불린다.
영못에는 슬픈 전설이 있다. 신라시대에
불국사를 창건하면서 탑을 세웠다. 부여에서
아사달 석공이 탑을 만드는 중에 아사녀가
멀리서 걸어 찾아왔다. 그러나 여자가 중대
한 공사 중에 만나면 부정 탄다고 아랫마을
영못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탑이 완성
되면 그림자가 비칠 때 만날 수 있다고 일러
주었다. 너무 오래 걸려 그만 아사녀는 지쳐
서 영못에 빠져 죽고 말았다. 탑이 완성되고
아사달이 찾아왔으나 이미 죽고 없어서 못
입구에다 불상을 만들었다. 불국사 석가탑은
끝내 그림자가 안 비춰서 “무영탑”이라고까
지 불렀다.
뜨거운 여름날 영못에 가면 저만치 물 위
에 나와 있는 말밤쇠 잎은 마름모꼴로 길이
보다 너비가 더 길며, 잎 가장자리에는 큰 톱
니들이 고르지 않게 나 있다. 7~8월 물 위에
나와 있는 잎의 잎겨드랑이에 한 송이씩 작
은 하얀 꽃이 핀다. 꽃자루가 처음에는 위로
곧추 서 있으나 열매가 익어가면서 밑으로
숙여져 열매는 물속에 있다. 열매에는 뼈대
처럼 매우 딱딱한 뿔 두 개가 양쪽으로 달린
다. 모양새만 보면 참 요상 하게도 생겼다.
못에 물이 빠지고 나면 바닥 진흙이 말라
가면서 우리는 말밤쇠를 캐낸다. 맨손에 나
무꼬챙이 하나로 진흙을 파헤쳐 캤다. 그것도 귀하다고 호주머니에 넣고 오는 동안 내
내 내 다리를 찔러댔다. 말밤쇠 침은 철조망
화살처럼 생겨서 찔리면 잘 빠지지 않아 아
팠다. 집에 돌아오면 “말밤쇠 캐 왔다.”고 큰
소리치며 엄마에게 넘긴다. 내 작은 손가락
마다 말밤쇠 침이 박혀서 시 알리기 시작한
다. 시간 나는 대로 작은 톱니처럼 생긴 새카
만 가시를 찾아내어 빼내었다.
오늘날에는 이 말밤쇠가 항암 작용을 하는
약용으로 쓰인다고 한다. 어렸을 때 윤사월
긴긴 해 배고픔에 말밤쇠라도 캐서 요기하
여야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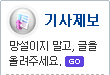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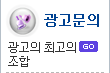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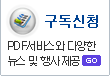









 APEC 정상회의 문화산업고위급대화 성황리 개막..
APEC 정상회의 문화산업고위급대화 성황리 개막..